“옷걸이”
우리의 삶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비교의식'이다.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그런 내가 한 없이 작게 보이고, 가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반대로 나보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지도 모른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극명하게 비교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옷걸이'다.
'옷걸이'는 '옷'이 아니라, '걸이'다. 그러므로 옷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전혀 없다. 당연히 '걸이'인 나의 뜻이 아니라 옷에 맞추어져 제작되었다.
시선의 주목을 받는 것도, 물론 옷걸이가 아니다. 옷이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도 옷걸이는 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몇 년씩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도 아닌 소모품일 뿐이다.
등이 휘어도 말할 수 없다. 허리가 굽어도 펼 수 없다. 구석에 쳐 박혀 있어도 소리 지를 수 없다. 나 하나 정도 없어져도 개의치 않는다. 비싼 옷이 입혀지든, 싼 옷이 입혀지든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늘 그대로다.
그러나, 옷걸이는 당당하게, 꿋꿋하게 '걸이'로서의 본분에 충실 한다. 아니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킨다.
옷걸이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콧노래를 부른다.
'내가 있어야 정리가 돼.' '내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지.' '내가 있어야 맵시가 나잖아.' '내가 있어야 장사가 돼.' '내가 무너지면 옷도 무너진다.'
화려하게 주목받지는 않아도 요긴하게 쓰이는 자신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쓰다듬어 주며 살았더니, 옷걸이의 형태가 어느 날 삼각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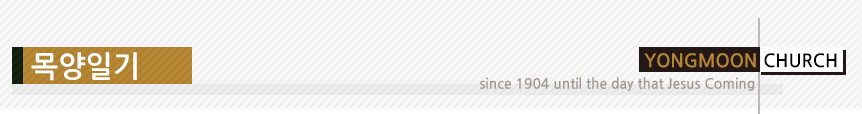
Facebook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