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소리가.......”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일곱 시간 비행을 하고, 다시 국내선 비행기로 갈아타고 한 시간을 비행하여 ‘빨렘방’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최 선교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와 자동차로 한 시간 반을 가는데, 우리나라 60년대 도로 사정보다 좋지 않아 보였다. 비포장이었음은 물론이고,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 험한지 속이 다 울렁거릴 정도였다.
밤 아홉시가 넘어 도착했는데도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놓으신 저녁식사를 했다. 이 날 한국음식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댁에 와서 처음 먹었다. 하루 종일 기내식, 커피와 빵 종류를 먹고 와서 그런지 한국 시간으로는 밤 열한 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맛이 있었다.
선교사님 댁 방 하나를 주셔서 씻고 잠자리에 드는데,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선교사님께서 내 주신 방은 열대 지방의 집답게 널찍널찍한 창문이 벽의 두 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방이었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다. 녹음기가 있으면 녹음해 놓고 싶은 충격적이고 또한 환상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 그리고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개구리 소리, 맹꽁이 울음소리.... 그리고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개구리 소리 비슷하지만 개구리보다는 훨씬, 아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우렁차고, 창문이 울릴 정도의 괴물의 울음소리 같은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 여기가 열대 지방은 열대지방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 이곳은 쥐도 토끼만 하다고 했다. 너무 커서 이곳 고양이는 쥐를 잡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피곤해서 그런지 첫날밤은 그 요란하고 이상야릇한 열대 지방의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에 파묻혀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은 창가에 몰려와 노래하는 온갖 새들의 합창소리에 눈을 떴다.
이러한 울음소리는 이튿날 밤에도 계속되었다. 아침의 새소리도 물론이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밤에는 그 요란한 울음소리가 한결 적게 들렸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볕이 내리쬐더니 습기가 가셔서 그런지 그 요란한 개구리 소리,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낯선 선교지에 적응하게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오신 지 19년, 이곳 ‘빨렘방’에 오신 지는 14년이 되셨다고 하셨다.
초창기에는 이곳이 완전한 불모지, 열대 정글이었다고 하셨다. 그런데 하나하나 개간하여 건물을 짓고 학생을 모집하고, 오늘의 신학교를 이루신 것이다. 초창기의 고생이 어느 정도였을지 쉽게 그려졌다. 모습만 뵈어도 저절로 존경이 되었다.
밤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다.
한결 평안한 마음으로 선교지에서의 셋째 날 밤, 잠자리에 든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잠자리에 든다.
저 건너 기숙사에서 학생들 소리가 들려온다. 잠잠하다 싶었던 그 괴물(?)의 울음소리도 간헐적으로 다시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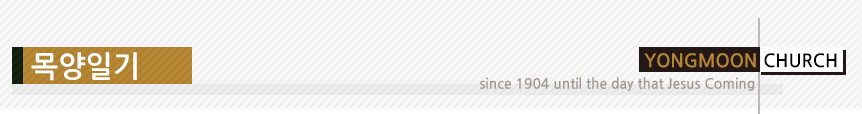
Facebook Comment